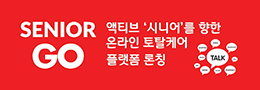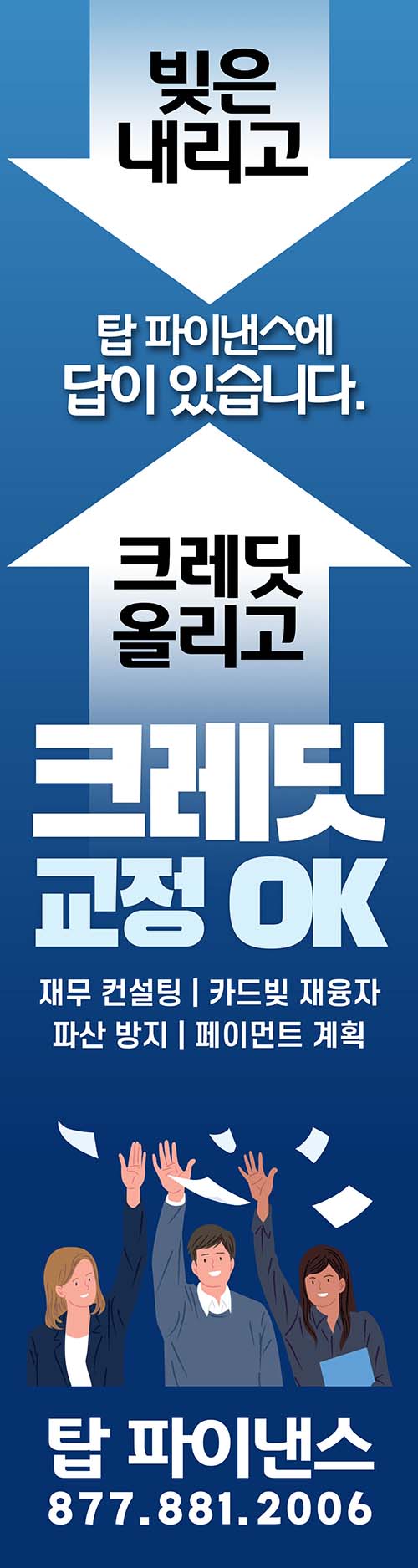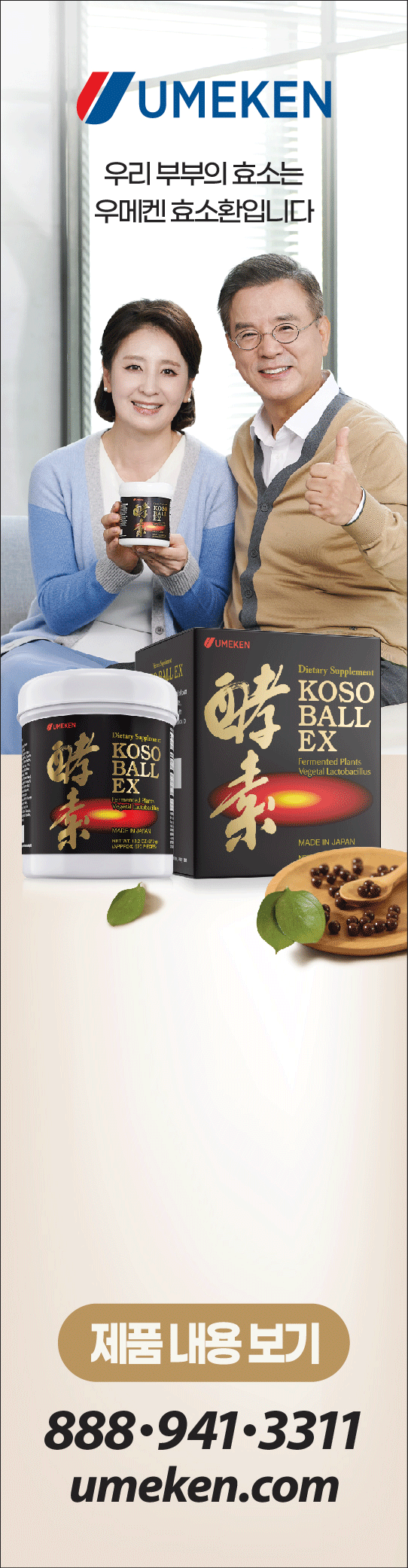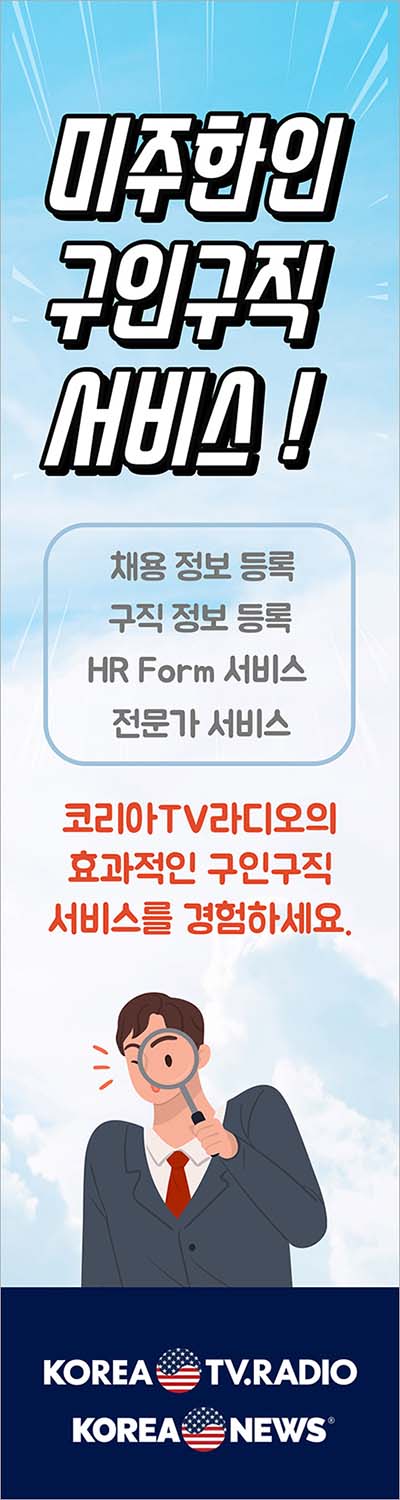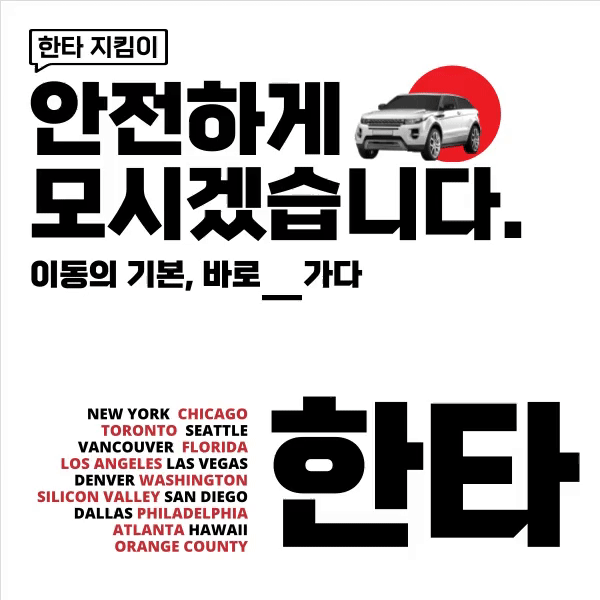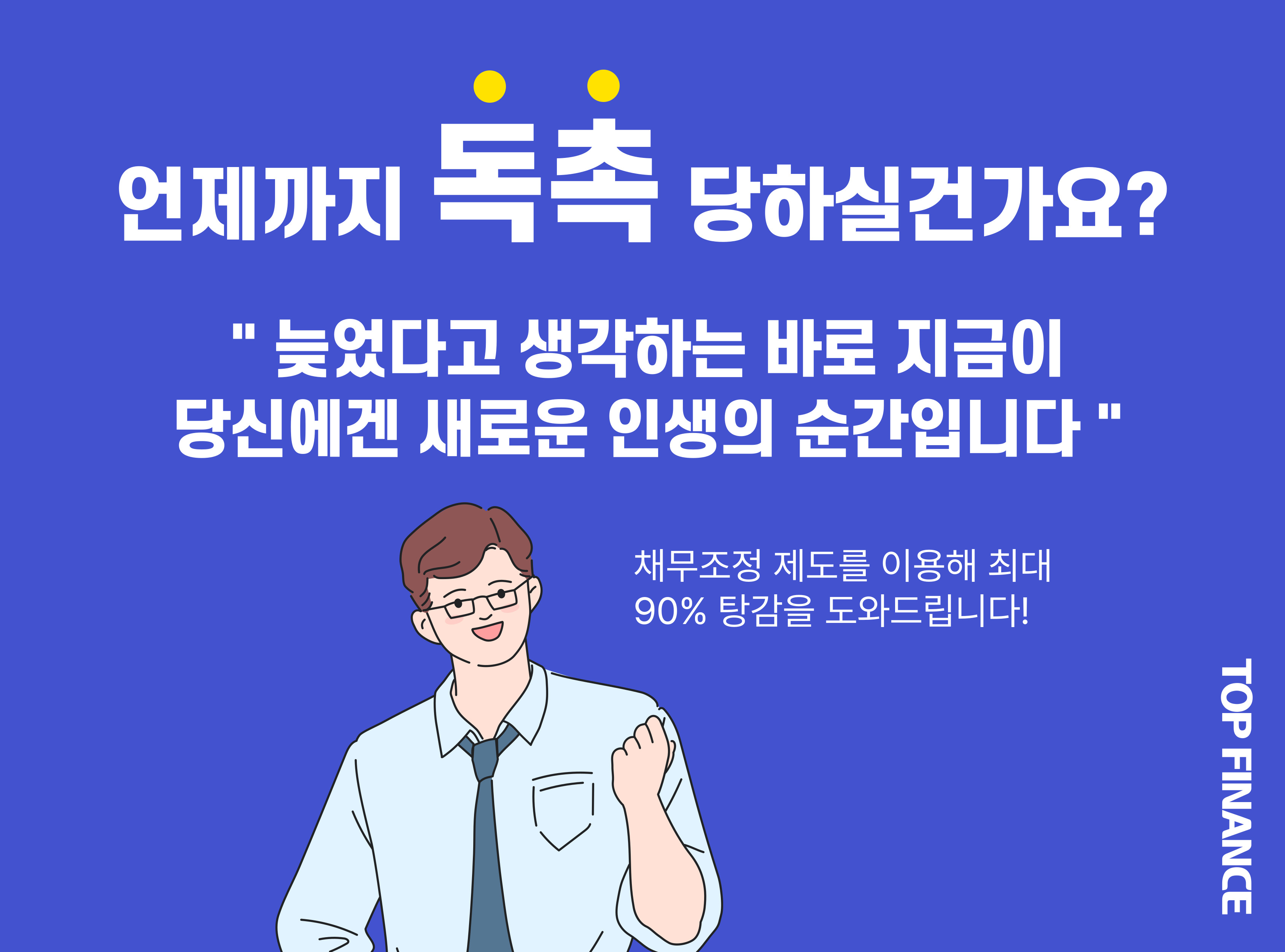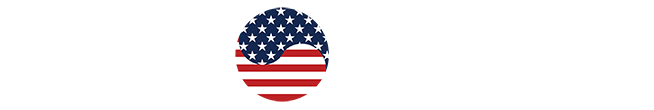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29일 오후 3시 45분 100세로 별세했다. 역대 미 대통령 중 가장 장수한 카터는 지난해 2월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자택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부인 로절린(96)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미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7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대통령 부부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과 세계는 비범한 지도자, 정치인, 인도주의자를 잃었다”며 “위대한 미국인을 기리기 위해 국장(國葬)으로 치를 것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카터가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 점에 대해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며 “그는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를 떠난 뒤 대다수 대통령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카터는 ‘가장 성공한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평가 속에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세계의 원로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카터는 남북한에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위선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안보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77년부터 4년간 재임 시 남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주한 미군 철수를 추진, 박정희 정권과 불화(不和)했다. 1970년대 후반 한미동맹 와해 위기로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든 데 이어 퇴임 후에는 1994년부터 세 차례 방북하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 밀착했다.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며 대화만을 강조, 결과적으로 김일성 일가의 대남 정책에 활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퇴임 후 카터의 관심은 북한으로 향했다. 1994년 6월 1차 북핵 위기 중에 카터는 클린턴 행정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김일성의 초청을 받아들여 평양을 방문했다. 김일성과 ‘대동강 뱃놀이’를 하며 환대받은 카터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중단하면 북한도 핵 개발을 동결하겠다’는 김일성의 말을 믿었다. 이를 백악관에 전달한 후 즉시 CNN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카터의 생방송 인터뷰에 강경 정책을 검토하던 클린턴 행정부가 급선회, 북한의 핵 개발 포기 대가로 경수로를 건설해 주는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다.
제네바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핵 6자 회담이 열렸지만, 이는 북한의 시간 끌기용 전략이라는 사실이 차츰 드러났다. 제네바 합의 30년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말하면서 카터의 중재가 북한이 핵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해줬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카터는 2010년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6자 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가 조 리버먼 상원 의원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에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기고를 하기도 했다.
카터는 전 세계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며 ‘휴머니스트’로 살아왔지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2011년 4월 마지막으로 방북 후 서울에 온 그가 이같이 반박했다. “북한에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직접 통치하지 않는 입장에서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소련의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민주주의를 말한다’의 저자 나탄 샤란스키는 카터에 대해 “ ‘평화’나 ‘안정’ 같은 명목 아래 악(惡)을 자행하는 독재자들의 허위와 위선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