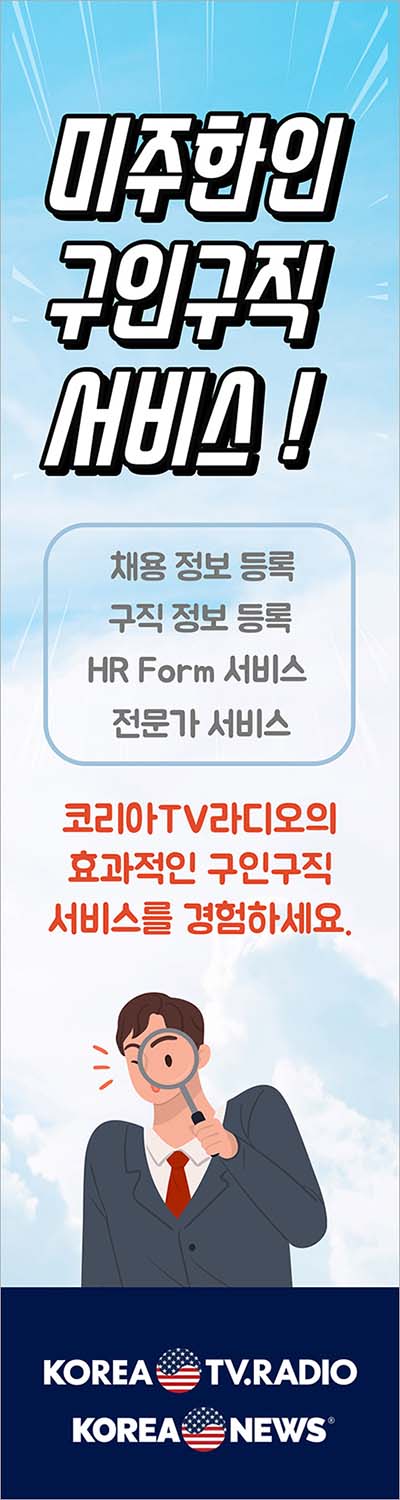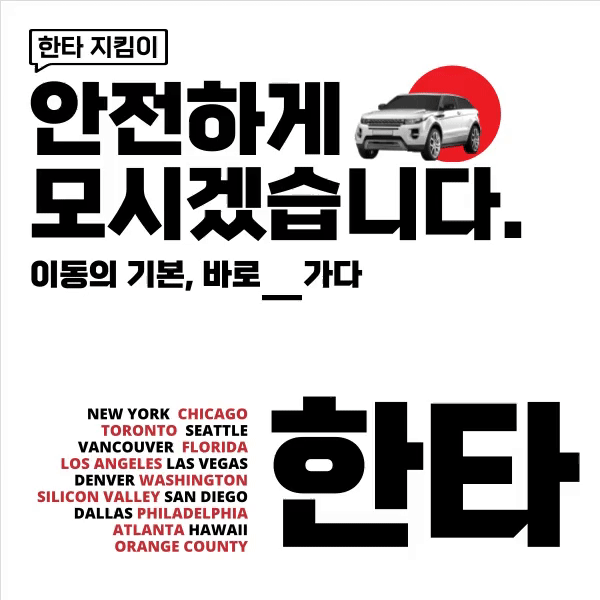과로죽음은 어떻게 은폐되는가
자본권력과 한국사회의 노동문화 실체를 규명하는 책
일터 은어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노동조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콜센터 노동자는 화장실에 드나들 때마다 메신저로 '화출·화착'을 보고해야 한다. 서비스물류 노동자는 밤늦게 매장을 닫고 퇴근한 뒤 새벽에 다시 매장 문을 여는 '클로프닝' 탓에 휴식시간을 보장받기는커녕 매장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느 직장인들은 '카톡 감옥'에 갇혀 산다.
게임 노동자의 '크런치 모드', 간호 노동자의 '태움'은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됐다. 일터에서 고통과 비참함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소식이 빈번하게 전해져서다.
신간 '존버씨의 죽음'(오월의봄)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과로죽음(과로사·과로자살)을 추적하고 자본권력과 한국사회의 노동문화가 그 실체를 어떻게 감추는지 규명하는 책이다.
저자는 "과로와 죽음 간의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꽤 멀다"고 말한다. 가까운 이유는 과로죽음이 과로와 성과체제가 결합해 반복되는 '일반적인'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배권력의 편에서 죽음과 업무의 연관성을 분리하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자살은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주장, 영업비밀 보호논리는 죽음과 과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 근면과 근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국의 노동문화도 과로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데 한몫한다.
![[오월의봄 제공]](http://web.korearadio.org/wp-content/uploads/2022/01/오월의봄-제공.jpg)
"그렇게 힘들면, 그냥 그만두면 될 거 아냐?" 노동자 자살사건 기사에 으레 달리는 댓글이다. 그러나 죽는 게 나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는 그만둠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강력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퇴직금을 깎겠다는 협박, 업계의 낙인, 손해배상 청구 등은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라'는 주문은 이미 버틸 대로 버틴 이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분노로 전환될 수 있다. 이같은 분노는 종종 특정인의 처벌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로 표출된다.
저자는 과로죽음을 "언어 없는 사건, 개념 없는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노동자 자살사건을 다룬 기사들은 근본적 문제인 과로 대신, 그에 따른 증상인 우울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과로의 누락은 자살예방 캠페인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과로자살 사건은 우울을 유발하는 구조가 아닌 우울을 앓는 개인에 방점이 찍히고, 마음치유와 정신상담·심리치료 같은 개인 단위의 해법만 덧대진다.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은 1980년대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정보통신혁명과 아웃소싱 확대, 노동 분야 규제 완화 등을 기회 삼은 자본의 '역공'이 거세다. 저자는 어느새 노동자들도 내면화한 '과로+성과체제'를 낯설게 보자고 제안한다. '옛날에는 더했다'며 '존버'를 강요하는 일터 문화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저자는 "과로+성과체제를 당연시하는 야만의 언어가 활개 치고 있다"며 "자본의 논리와 친화적인 불가피성의 논리를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불가피성은 노동의 고통과 희생을 연료로 갈아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지음. 3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