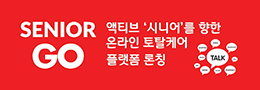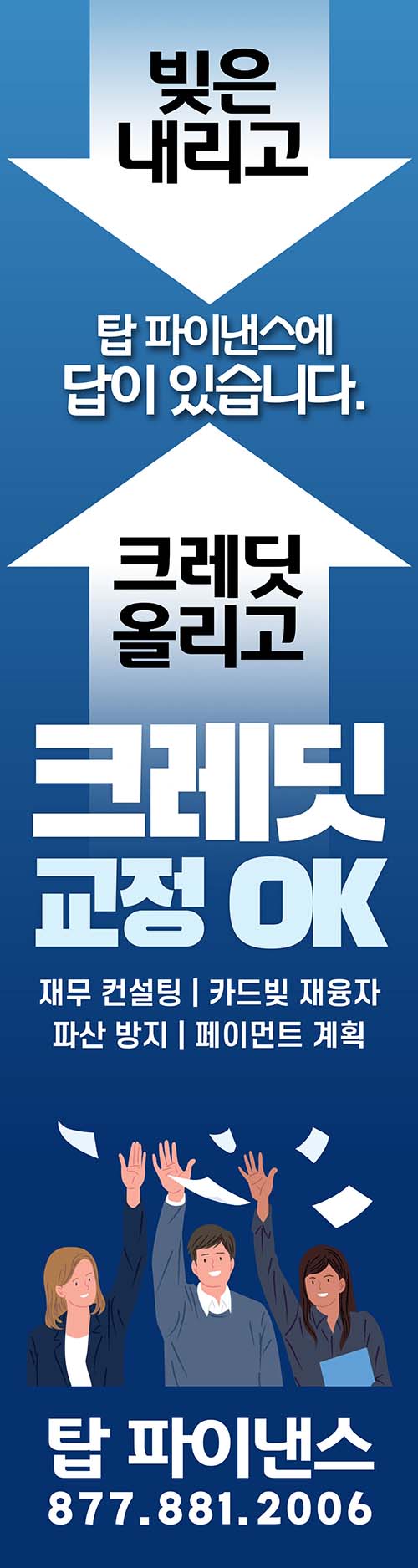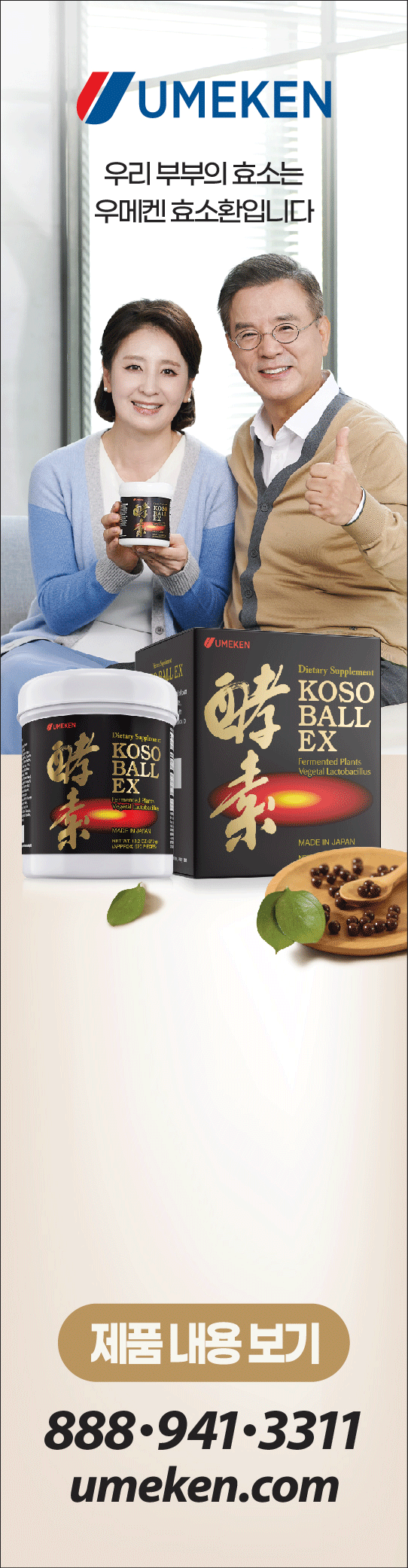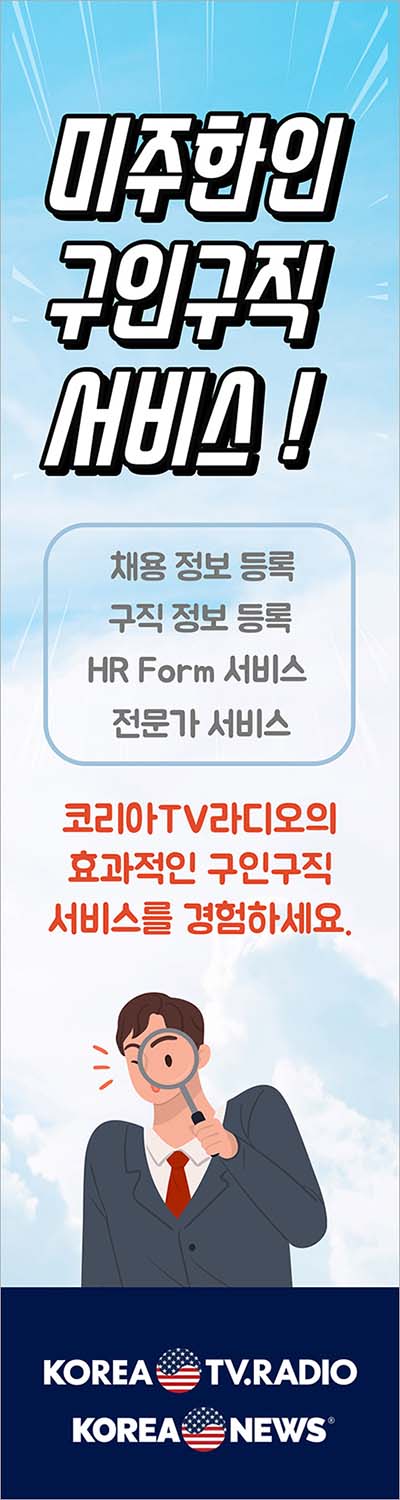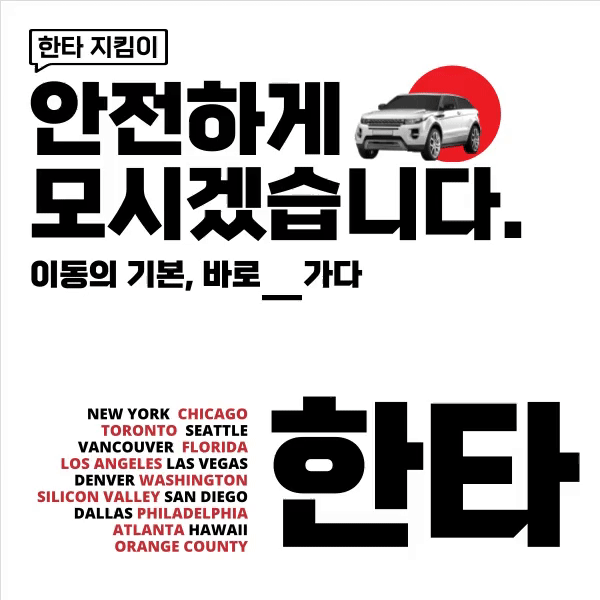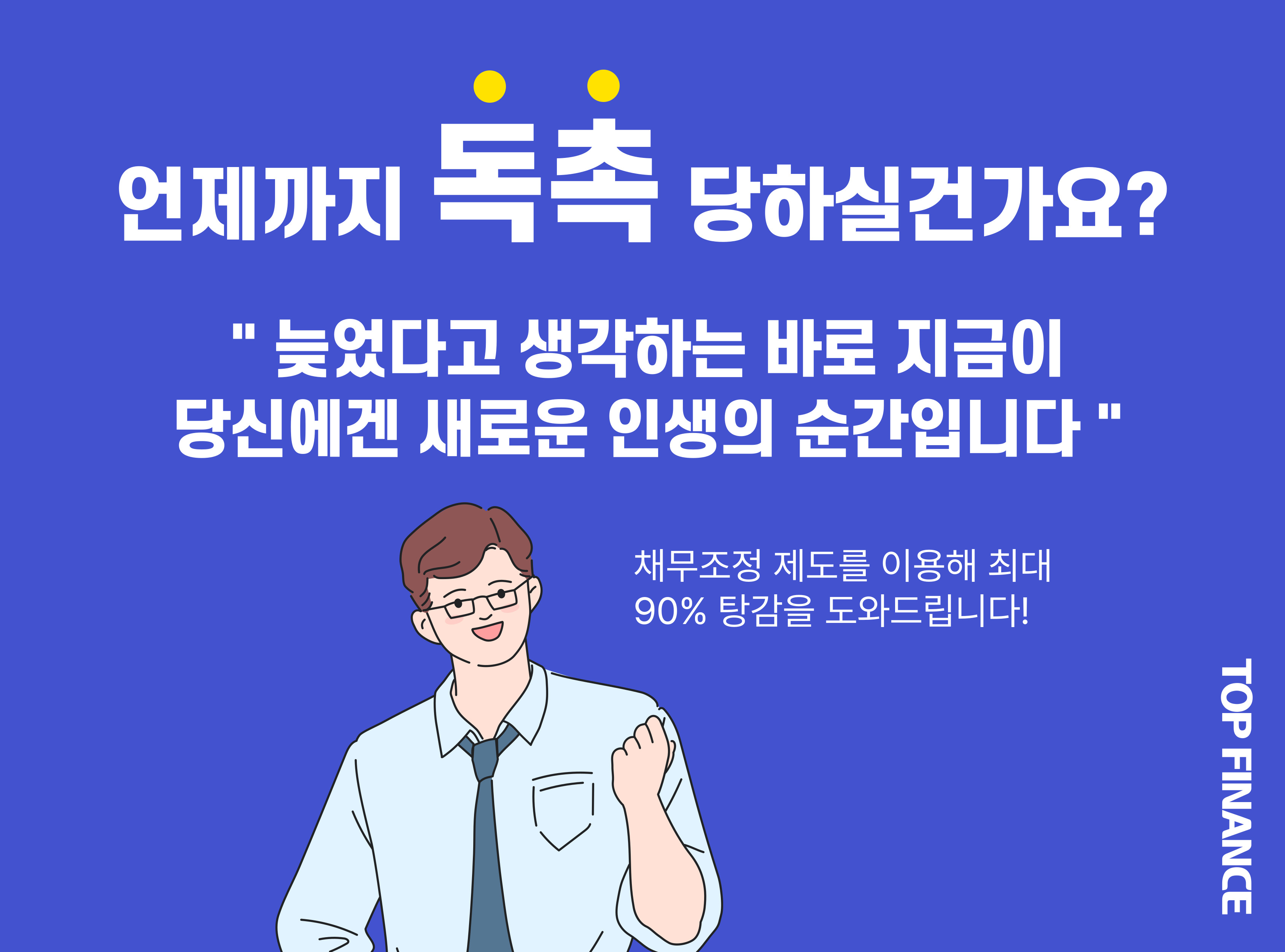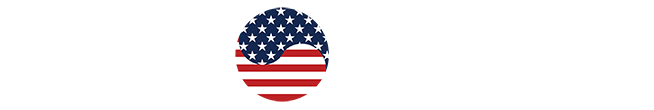![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http://www.koreatvradio.com/data/photos/20251148/art_17641721328547_d9666c.jpg?iqs=0.9302872344193531)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2025년 11월 26일, 네이버가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주식교환 합병을 전격 발표했다. 겉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화려한 수사를 내세웠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네이버가 금산분리 원칙을 교묘히 우회하는 특혜성 인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대기업들의 금융 진출 시도가 규제의 벽에 부딪혀 좌절된 사례를 떠올리며 “네이버만 가능한 꼼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합병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자. 주식 교환 비율은 네이버파이낸셜 1주당 두나무 0.394주, 즉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1:2.54다. 기업가치 비율은 1:3.06에 달한다. 합병 후 두나무 송치형 회장(19.5%)과 김형년 부회장(10%)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가 되지만, 이들은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전량 네이버 측에 위임한다.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의결권 46.5%를 확보하며 실질 지배력을 유지,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전환되며, 금융 규제의 그물을 피하는 모양새다.
문제의 핵심은 금산분리 원칙이다. 한국에서 산업자본(비금융 대기업)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 원칙은 1980년대부터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이라는 ‘금융사’를 앞세워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통째로 삼키는 셈인데,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이 10조~20조 원을 오가는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는 전통 금융사를 능가하는 ‘금융 제국’ 건설이나 다름없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엄밀히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법적 회색지대를 파고든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카카오뱅크 출범 사례와 비교되며 더욱 날카로워진다. 카카오뱅크는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후 2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7월 27일 공식 출범했다. 케이뱅크에 이은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금융당국은 “기존 은행의 불편을 재해석한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허가를 내줬다. 출범 당시 카카오뱅크는 금융과 ICT 융합을 강조하며,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 도입으로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송금·환전 등 혁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분 구조도 카카오가 33.53%로 최대주주지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8.60%), 국민은행(9.86%) 등 금융사들이 참여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했다. 출범 5일 만에 100만 고객, 12일 만에 200만 고객을 돌파하며 폭발적 성장을 이뤘고, 2022년 기준 고객 수 20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 선진화와 디지털 혁신이라는 뚜렷한 명분 덕에 규제 완화가 가능했던 셈이다.
반면 네이버의 이번 합병에는 그런 명분조차 희박하다. 재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적어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내세워 당국의 승인을 얻었다. 그런데 네이버는? ‘AI·블록체인·웹3’ 같은 추상적 단어만 반복할 뿐, 왜 네이버만 가상자산 거래소를 우회 인수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으로 이미 금융 영역에 발을 들였지만, 대형 금융사 인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논란은 과거 대기업들의 금융 진출 좌절 사례를 되새기며 더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2000년대 초반 금융 지배력 강화 시도로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했다. 2008년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금산법 제24조(금융기관의 비금융사 지분 20% 초과 소유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가 그룹 내 비금융사 지분을 과다 보유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금융당국의 제재와 법 개정 논란으로 후퇴했다. 참여정부 시절(2007년)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있었지만, “삼성 봐주기”라는 여론 반발로 무산됐다.
LG그룹도 비슷한 좌절을 겪었다. 2003년 LG카드 사태(신용카드 부실로 인한 위기) 여파로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해야 했고, 2015년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을 KB증권에 넘겼다. 금산분리 규제로 대기업이 금융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현대그룹 역시 1990년대 금융 진출을 시도했으나, 재벌 개혁 차원에서 막혔다. 최근 2025년 들어 AI·핀테크 경쟁 격화로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지만(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대기업 CVC 확대 제안), 여전히 “재벌의 금융 악용” 우려로 진척이 없다. 한 대기업 임원은 “삼성·LG처럼 금융 진출 꿈도 못 꾸고 규제에 발목 잡혔는데, 네이버는 왜 예외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대기업 금융팀들도 이번 소식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우리도 금융사 인수하고 싶어서 안달 났는데, 당국이 손발 묶어놓고 네이버한테만 길 터주는 꼴”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할 거면 전면적으로 하지, 왜 특정 기업만 꼼수로 빠져나가게 내버려두나”라는 지적도 쏟아진다. 네이버페이나 마이데이터 사업 하나 추진할 때마다 금융위의 칼끝을 의식해야 했던 타 그룹들은 이번 딜을 “네이버 특혜”로 규정짓고 있다.
네이버 측은 “AI·블록체인·결제 인프라의 융합으로 글로벌 도전과 K-핀테크 저력 발휘”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논란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27일 네이버 제2사옥에서 열리는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이번 합병을 승인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결국 이 합병은 ‘네이버만 가능한 특혜’냐, 아니면 ‘금산분리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다른 대기업들은 이를 갈며 지켜보고 있지만, 만약 네이버가 성공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금융 규제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인 셈이다.